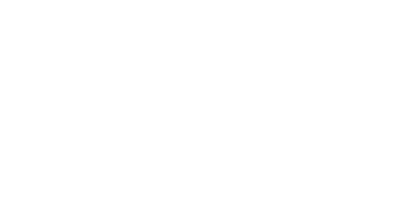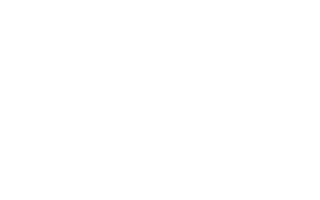[언론보도] 박영준 교수, [사이언스프리즘] 4차 산업혁명의 본질(2018.01.31)
작년 말 미국의 중부 켄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켄터키대학에서 필자가 연구하는 암진단 칩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교수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해 놀랐다. 이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선 지난 2년간 가장 중요한 사회의 주제어로 확산됐다.
기술혁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후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인 1차 산업혁명, 2차 대량생산혁명, 3차 정보혁명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소위 다보스포럼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언급된 용어이다. 과연 4차 혁명이 인류사에 적합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하는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및 뇌기술, 3D프린팅,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기술 등이 이해하기 힘든 기술이다 보니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역사가 역시 당황해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 기계학습로봇 등 기술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된 용어이다. 대학에서는 30년 전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갑자기 4차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포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본질을 들고 싶다. 하나는 ‘한계비용 제로(0)로 접근하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간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계비용 제로는 정보를 만들고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의 경우 매년 70억명의 인구에게 1인당 1개의 기가비트D램(Giga bit DRAM)과 10개의 기가비트낸드(Giga bit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각각 1달러, 3달러씩에 제공한다. 불과 40년 전 세계 총소득과 맞먹는 값을 지금은 ‘수천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저장뿐만이 아니다. 친구에게 메가비트 용량의 사진을 보낼 때도 10원도 들지 않는다. 그것도 눈 깜짝할 새에 말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계산·전송·정보처리를 택시기본비 정도로 처리하는 형국이 됐다.
예전에는 계산량이 너무 크고 값이 비싸 못하던 AI 학습이나 알고리즘 개발도 비용 걱정 없이 하고 있다. 유전공학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수조 유전자(DNA) 정보를 100만원 이하로 읽을 수가 있게 되다 보니 누구나 이 정보를 갖고 유전정보도 알아내고 제약 개발에도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컬러TV가 나오고 난 후 쇼비즈니스, 의료비즈니스, 화장품, 교육혁명이 빠르게 진행됐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혁명 역시 정보처리·저장·통신의 가격 ‘제로’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시대의 신데렐라인 아마존이 잘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제로’에 기초하고 있다.
아직도 비싼 것은 무엇인가. 이는 두 가지로 ‘정보를 채취’하는 것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보 채취를 위해 아직도 비싼 ‘센서’가 쓰인다. 카메라, 터치센서, 녹음기, 가스센서, 맛 등은 아직 비싸다. 이것은 사물인터넷(IoT)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한 정보처리와 통신이 싼 만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비싸다. 테러분자가 사물인터넷망으로 해킹해 가정의 가스오븐이나 냉장고를 조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자율주행차의 컴퓨터를 해킹하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다. 현재 유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역시 바로 이러한 4차 혁명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 기계학습으로 무장된 로봇이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친구보다는 AI 로봇을 더 좋아하고 의사나 법률전문가보다는 AI에 더욱 의존하도록 인간의 뇌가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본질의 이해가 4차 혁명이 가져다줄 변화와 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기술혁명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후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인 1차 산업혁명, 2차 대량생산혁명, 3차 정보혁명과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소위 다보스포럼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언급된 용어이다. 과연 4차 혁명이 인류사에 적합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하는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및 뇌기술, 3D프린팅,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기술 등이 이해하기 힘든 기술이다 보니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역사가 역시 당황해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 기계학습로봇 등 기술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된 용어이다. 대학에서는 30년 전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갑자기 4차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포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본질을 들고 싶다. 하나는 ‘한계비용 제로(0)로 접근하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간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계비용 제로는 정보를 만들고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의 경우 매년 70억명의 인구에게 1인당 1개의 기가비트D램(Giga bit DRAM)과 10개의 기가비트낸드(Giga bit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각각 1달러, 3달러씩에 제공한다. 불과 40년 전 세계 총소득과 맞먹는 값을 지금은 ‘수천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저장뿐만이 아니다. 친구에게 메가비트 용량의 사진을 보낼 때도 10원도 들지 않는다. 그것도 눈 깜짝할 새에 말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계산·전송·정보처리를 택시기본비 정도로 처리하는 형국이 됐다.
예전에는 계산량이 너무 크고 값이 비싸 못하던 AI 학습이나 알고리즘 개발도 비용 걱정 없이 하고 있다. 유전공학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수조 유전자(DNA) 정보를 100만원 이하로 읽을 수가 있게 되다 보니 누구나 이 정보를 갖고 유전정보도 알아내고 제약 개발에도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컬러TV가 나오고 난 후 쇼비즈니스, 의료비즈니스, 화장품, 교육혁명이 빠르게 진행됐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혁명 역시 정보처리·저장·통신의 가격 ‘제로’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시대의 신데렐라인 아마존이 잘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제로’에 기초하고 있다.
 |
| 박영준 서울대 교수 |
아직도 비싼 것은 무엇인가. 이는 두 가지로 ‘정보를 채취’하는 것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보 채취를 위해 아직도 비싼 ‘센서’가 쓰인다. 카메라, 터치센서, 녹음기, 가스센서, 맛 등은 아직 비싸다. 이것은 사물인터넷(IoT)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한 정보처리와 통신이 싼 만큼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비싸다. 테러분자가 사물인터넷망으로 해킹해 가정의 가스오븐이나 냉장고를 조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자율주행차의 컴퓨터를 해킹하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다. 현재 유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역시 바로 이러한 4차 혁명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 기계학습으로 무장된 로봇이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친구보다는 AI 로봇을 더 좋아하고 의사나 법률전문가보다는 AI에 더욱 의존하도록 인간의 뇌가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본질의 이해가 4차 혁명이 가져다줄 변화와 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