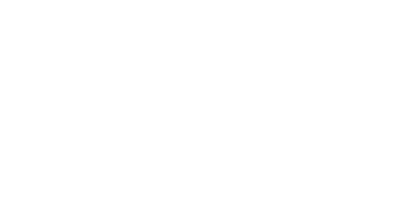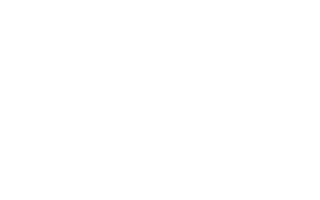[언론보도] 이병호 교수, [과학자가 해설하는 노벨상]레이저 기술 혁신 가져온 3人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혁신적 발명으로 평가받는 두 분야에 주어졌다. '광학집게(광 핀셋)'와 이를 생물학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한 아서 애슈킨 미국 벨연구소 박사(96)와 에너지가 크고 매우 짧은 광 펄스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한 제라르 무루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니크 교수, 또 그의 제자인 도나 스트리클런드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두 분야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 하지만 레이저 분야의 매우 중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긍하고 있다.
올해 96세로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 기록을 갈아치운 애슈킨 박사는 레이저를 이용한 집게를 만들었다. 우리는 작은 물체를 갖고 관찰하며 연구하기 위해 그 물체를 집게나 핀셋으로 잡아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고정시킨다. 그런데 그 물체가 세포나 지름이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밖에 안되는 작은 입자, 또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인 경우 이를 잡을 도구가 없다.
하지만 세포나 작은 입자에 레이저 빛을 쪼여 초점을 맞추면, 원하는 위치로 옮기거나 특정한 위치에 붙잡아 둘 수 있다. 이 기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애슈킨 박사다. 그는 1970년부터 관련 논문을 내기 시작해서 1986년에 이를 완성한 논문을 발표했다. 원리는 관찰하려는 입자 크기가 레이저 빛의 파장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 조금 다르다.

보통은 관측하려는 입자에 빛이 들어가면 굴절되어 나온다.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갖지만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빛의 입자(광자)와 관측하고자 하는 입자의 총 운동량의 합은 보존돼야 한다. 관측하려는 입자에 빛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광자 방향이 꺾이면서 운동량이 변하는데, 그 변화량은 관측하는 입자에 전달돼 입자가 움직인다. 이런 원리로 입자는 빛이 가장 센 곳, 예를 들어 초점을 맞춘 레이저 빔의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른바 광학 집게로 불리는 이 기술은 오늘날 여러 분야로 파생됐다.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관찰하거나 소용돌이와 같은 형태의 레이저 빛을 쪼여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학술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원자를 포획해 극저온으로 온도를 낮춰 특성을 연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로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다. 스티븐 추 교수는 그 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발탁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다.
1986년 광학집게 논문의 첫 저자는 애슈킨 박사였고 마지막 저자는 추 교수였다. 이런 이유로 추 교수가 1997년 노벨상을 받자 애슈킨 박사도 받았어야 했다는 말이 학계에서 돌았다. 그후 21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애슈킨 박사를 뺐던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새 초고해상도 광학현미경 기술의 발달과 함께 광학집게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무루 교수와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처프펄스증폭(chirped pulse amplification, CPA)기술을 고안해 강한 에너지를 갖는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었다. 1985년에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지도교수이던 무루 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했다. 레이저에서 나온 펄스 세기를 크게 키우려면 증폭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빛이 세면 이 증폭 장치가 손상을 입어 광 세기를 증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당시 레이다에 쓰인 기술을 변형시켜 레이저에 적용했다.
두 개의 격자를 이용하면 짧은 레이저 펄스를 파장의 성분에 따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펄스의 시간폭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빛의 세기는 작아지는데 이렇게 세기가 작아진 빛을 증폭기로 증폭시킨 다음 다시 격자 두 개를 이용해서 시간적으로 압축하면, 매우 큰 세기와 짧은 시간폭을 갖는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다. 짧은 레이저 펄스를 증폭하려면 증폭장치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길고 작은 세기의 펄스로 바꾼 후 이를 증폭시켜 시간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짧고 강한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원리다.
이 기술은 이후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표준기법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이 기술을 활용해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 빛과 물질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무루 교수와 스트리클런드 교수가 쓴 1985년 논문에서는 펄스 폭이 2피코초 (ps·1ps 1조분의 1 초), 에너지는 1mJ(1000분의 1J)에 불과했다. 지금은 펄스 폭은 펨토초(1000조분의 1초)나 아토초 (100경분의 1 초), 세기는 페타와트 (PW·1PW는 1000조W)에 이른다. 이런 극초단 초강력 레이저는 빛과 물질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물리학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특히 이보다는 훨씬 약한 빛의 경우(그래도 여전히 짧은 고출력 펄스)는 라식 같은 안과 수술에도 이용되고 있다. 두 사람은 한국에도 다녀간 일이 있는데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미국광학회(OSA)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광학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광학은 과학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하게 이용된다. 유엔(UN)에서는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한 바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5월 16일을 “세계 빛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이는 1960년 5월 16일 미국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만들어 동작시킨 날을 기리고,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광학 분야는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기로도 유명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09년 물리학상은 광섬유를 연구해 광통신의 길을 연 찰스 가오 전 홍콩 중문대 총장(지난달 타계)과 디지털 카메라 소자인 컬러 전하결합소자(CCD)를 만든 윌러드 보일과 조지 스미스 벨연구소 박사에게 돌아갔다. 또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최초로 개발한 아카사키 이사무 일본 메이조대 교수와 아마노 히로 나고야대 교수, 나카무라 슈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샌타바버라) 교수가 차지했다. 같은 해 노벨 화학상은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만든 학자들에게 수여됐고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