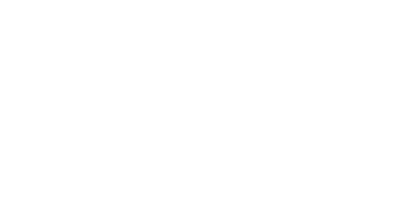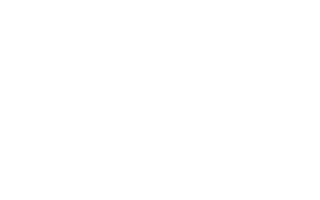[언론보도] 차상균 교수, 대학위기 방치하고 한국사회 지속 가능한가(매일경제,2021.12.27)
대기업 중심 산업체계 갇힌 獨
관성 깨려 대학 수월성 제고
연방법 개정해 연계·투자 확대
창업·기술이전 등 실용성 강화
정부 종속된 韓대학이 배워야

6년 전 주한 독일대사관 소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산하의 생소한 E-FI위원회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찾아왔다. 6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Forschung) 혁신(Innovation) 전문가 위원회'는 글로벌 관점에서 독일 대학과 대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국책연구소로 이뤄진 연구 혁신 생태계를 분석해 정책을 제언한다.
당시 위원장 하호프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잘 알았다. 막스플랑크 혁신경쟁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뮌헨대와 뮌헨공대가 지역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CDTM(Center for Digital Technology Management)의 이사다.
디지털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반나절 동안 독일과 한국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독일 산업은 100조원 내외 가치를 지닌 다수의 대기업이 이끌어왔다. SAP, 지멘스, 폭스바겐, 제약·화학 분야 머크그룹, 알리안츠, 도이치텔레콤, 다임러가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나뿐인 데 비해 독일은 100조원 가치의 대기업이 모든 산업군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수많은 강소기업과 대학, 국책연구소가 대기업들과 함께 독일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기존 생태계로는 글로벌 혁신 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10년 전 시작됐다. 나의 실험실 기업을 인수한 후 SAP HANA 프로젝트 출범을 전사적으로 이끌었던 전 SAP 최고경영자(CEO) 헤닝 카거만 박사가 퇴임한 후 독일 정부의 인더스트리4.0 시작을 도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앞장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원활하지 않았다.
E-FI와의 토론으로 독일도 기존 대기업 중심 체계로는 미래 독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호프 교수의 E-FI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독일이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독일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그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분권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와 대학재정 지원을 주정부 주도하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 결과 대학에 대한 투자는 파편화되고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2014년 독일은 과학기술 연구와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역할을 제한했던 독일연방 기본법 91b 조항을 개정해 변화의 길을 텄다. 이후 독일은 선도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이들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 투자를 늘려왔다.
한 예로 데이터가 모든 과학과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2018년 10년 동안 국가 연구 데이터 인프라(NFDI) 구축을 위해 매년 9000만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 생명과학 등 대학들이 주도하는 이 인프라 구축에만 1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수월성의 정의도 바뀌었다. 논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술 이전을 통해 실제로 쓰이는 연구로 바뀌었다. 뮌헨공대는 창업 대학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대학 출신들이 창업한 셀로니스는 올해 110억달러 가치의 데카콘이 됐다.
반면 정부의 지속된 통제와 파편화된 재정 지원에 길들여진 한국의 대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소득 격차, 노령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일소하려면 국가적으로 100조원 규모 기업 10개를 세운다는 목표로 대학 중심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흐름을 만들고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를 미래로 이끄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자본을 끌어들여 우리 대학의 혁신 연구 결과가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는 이런 변화의 기반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기사 원문 보기
관성 깨려 대학 수월성 제고
연방법 개정해 연계·투자 확대
창업·기술이전 등 실용성 강화
정부 종속된 韓대학이 배워야

6년 전 주한 독일대사관 소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산하의 생소한 E-FI위원회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찾아왔다. 6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Forschung) 혁신(Innovation) 전문가 위원회'는 글로벌 관점에서 독일 대학과 대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국책연구소로 이뤄진 연구 혁신 생태계를 분석해 정책을 제언한다.
당시 위원장 하호프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잘 알았다. 막스플랑크 혁신경쟁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뮌헨대와 뮌헨공대가 지역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CDTM(Center for Digital Technology Management)의 이사다.
디지털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반나절 동안 독일과 한국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독일 산업은 100조원 내외 가치를 지닌 다수의 대기업이 이끌어왔다. SAP, 지멘스, 폭스바겐, 제약·화학 분야 머크그룹, 알리안츠, 도이치텔레콤, 다임러가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나뿐인 데 비해 독일은 100조원 가치의 대기업이 모든 산업군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수많은 강소기업과 대학, 국책연구소가 대기업들과 함께 독일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기존 생태계로는 글로벌 혁신 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10년 전 시작됐다. 나의 실험실 기업을 인수한 후 SAP HANA 프로젝트 출범을 전사적으로 이끌었던 전 SAP 최고경영자(CEO) 헤닝 카거만 박사가 퇴임한 후 독일 정부의 인더스트리4.0 시작을 도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앞장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원활하지 않았다.
E-FI와의 토론으로 독일도 기존 대기업 중심 체계로는 미래 독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호프 교수의 E-FI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독일이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독일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그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분권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와 대학재정 지원을 주정부 주도하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 결과 대학에 대한 투자는 파편화되고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2014년 독일은 과학기술 연구와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역할을 제한했던 독일연방 기본법 91b 조항을 개정해 변화의 길을 텄다. 이후 독일은 선도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이들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 투자를 늘려왔다.
한 예로 데이터가 모든 과학과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2018년 10년 동안 국가 연구 데이터 인프라(NFDI) 구축을 위해 매년 9000만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 생명과학 등 대학들이 주도하는 이 인프라 구축에만 1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수월성의 정의도 바뀌었다. 논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술 이전을 통해 실제로 쓰이는 연구로 바뀌었다. 뮌헨공대는 창업 대학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대학 출신들이 창업한 셀로니스는 올해 110억달러 가치의 데카콘이 됐다.
반면 정부의 지속된 통제와 파편화된 재정 지원에 길들여진 한국의 대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소득 격차, 노령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일소하려면 국가적으로 100조원 규모 기업 10개를 세운다는 목표로 대학 중심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흐름을 만들고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를 미래로 이끄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자본을 끌어들여 우리 대학의 혁신 연구 결과가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는 이런 변화의 기반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