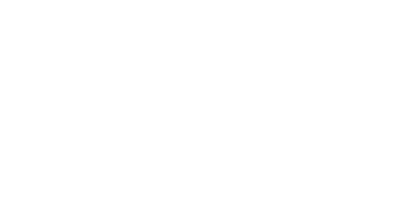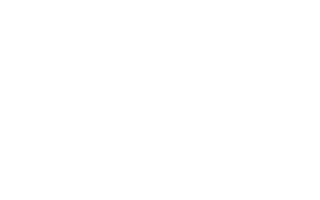[언론보도] [기고] 문제는 표절이 아닌 연구실적 (중앙일보, 2012.10.05)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부
공직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는 근래 가장 시끄러운 검증 항목의 하나가 됐다. 안철수씨의 경우에도 학생의 석사논문을 지도교수도 아니면서 공동저자로 학회지에 내고, 박사논문에 있는 수식이 다른 사람의 논문과 동일하게 틀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의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진흙탕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저자 문제를 보면 학문 분야에 따라 관행에 차이가 있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는 학생의 학술논문 출판에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대개 들어가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 논문은 대체로 ‘내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공계 분야는 논문 쓰는 과정이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학생과 교수의 공동 작업이고, 내용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도 공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과 지도교수 외에 제3자가 연구에 도움을 주고 공저자로도 들어간다. 다만 공저자가 남발돼 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는 일은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다.
다음은 학위논문을 저널이나 학술회의에 내는 것이 중복 출판 또는 자기 표절이 아닌가 하는 문제다. 논문 출판의 목적은 연구 결과나 주장의 전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절은 한정된 지면을 발행하는 유명 학회지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 뿐 논문 저자는 같은 아이디어를 독자층이 다른 여러 곳에 발표할 수 있다. 어떤 연구 결과는 보통 학생의 졸업논문에 일차적으로 발표되고, 이것이 심사가 간단한 학내 논문지에 나오며, 심사가 까다로운 학술회의나 저널에 게재되는 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중복 출판이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결과 평가 시 양적 측면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근래 연구 논문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의 질을 따지기 위해 그 논문이 다른 논문에 몇 회나 인용됐나를 알려주는 ‘인용지수’를 많이 이용한다. 인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논문이 학자들 가운데서 인정되고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준 횟수라 할 수 있다.
연구 업적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통한 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평가돼야 정상이다. 공저자나 자기 표절 등의 형식적인 문제보다 전체적인 발표논문의 수와 인용 횟수 등을 살피는 종합적인 면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씨의 경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임용 시에 제출된 논문을 보면 의대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외에 불과 서너 편에 불과하며 인용 횟수도 거의 없다. 그는 KAIST 교수로도 3년간 근무했지만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교수가 논문은 한 편도 안 쓰고 청춘콘서트로 전국을 누빈 것은 좋은 뜻이라 해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청춘콘서트의 배경에 걸린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와 함께’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그를 석학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당연히 잘못된 평가다.
어떤 사람의 연구 업적이 학계를 떠나서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재단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 논문의 결과나 메시지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표절 등 형식적인 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고치기 위한 언론과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향력 없는 몇 편의 논문으로 석학으로 불리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특히 어렵고 고독한 연구 대신에 대중강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쁜 교수들은 대학이 가진 학문적 권위를 의심받도록 만들고, 편집증적인 검증문화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안철수씨 측도 논문 검증에 발끈하기보다 이를 겸허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성원용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부
관련 링크: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05/9114016.html?cloc=olink|article|default